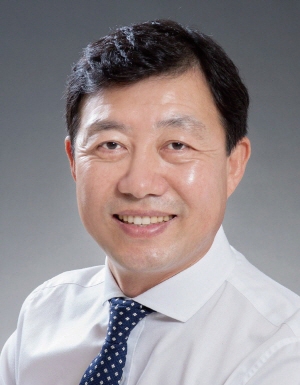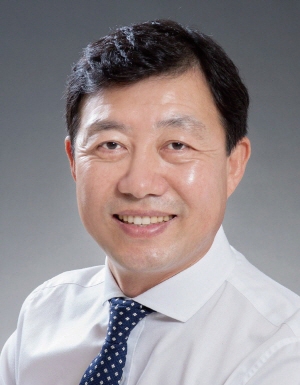
이 석 규
<전북예총 수석부회장/ 전북음악협회 회장>
가수 송대관이 부른 가요 중에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 제목이 있다. 일반적인 노래 가사지만 곱씹어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아픔도 미움도 슬픔도 다 사라져가는 현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만큼 세월, 즉 시간이라는 것은 잊혀진다는 망각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월을 탓하는 예전의 시구도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세월에 따라 변천사를 논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숙명적인 인생의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기도 한다.
또한, 세월이라는 이름에 붙여진 몇 년 전의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역시 곧 잊히지 않을까 한다. 세월호 참사가 세월이라는 시간의 장사에는 이기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면서 잊혀질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세월에 따라 조명되기는 하지만 아프고 슬픈 역사의 현실과 자신에게 닥쳐진 현실의 상황이 세월이 가면서 치유되거나 잊히면서 그냥 세월이 약이겠지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적인 신화만을 부풀리면서 세월을 무시하는 것들이 있으니 과연 세월이 약이 될 수 있는가도 반문해 본다.
사실 세월은 노래 가사 그대로 약이 될 수 있다. 그 약은 처방에 따른 약이 아니고 스스로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가치의 약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 치유되는 약이 될 것이니 세월의 흐름이 도도한 자연과 역사의 흐름에 반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세월이라는 말에는 역사의 흐름이 존재한다. 단시간 내에 노랫말처럼 약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단시간 내에 펼쳐지는 각종 인생의 희로애락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기쁨도 분노함도 아픔도 즐거움도 모두 인생에 있어서 일장춘몽이 된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일생이 아닌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면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 안에서의 세월은 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저절로 치유되는 자연적인 현상의 약이 아니라 집단 인류의 구성원 스스로가 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깝게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일생처럼 국가와 민족의 집단체계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현대사에 오늘에 이른 6·10에 관한 서설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6·10 만세운동이 있었던 1926년의 오늘이 있었고 가깝게는 1987년 6·1 0민주항쟁으로 이름 지어진 날이 있다. 전자는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임금의 승하에 따른 저항운동이었고 후자는 군부독재 하에서의 민주항쟁이었다.
두 개의 6·10운동이 성격은 다를지라도 그 의미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세월이 결코 약일 수 없는 반증이다. 이러한 저항운동이 세월이 지남으로써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사회적 여론과 이슈에 의해 치유되는 인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개인이 갖는 세월이 약이라는 상징성과 집단 지성에 의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세월을 구분하면서 우리 사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딘 감각과 생각 없이 지내는 만상들을 구분해 내야 한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진 긴장의 끈은 잠시라도 놓을 수 없다. 방역에 대한 성공적인 인식에 앞서 아직도 부분적인 감염확진자들이 생활환경 속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약이 아닌 세월이 독이 될 수 있다.
역사적 그날을 기억하면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세월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는 요즈음,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지난날 세월의 현장과 오늘의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의 한복판에서 약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본다.